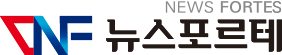세상에 오게 할 줄만 알았지 자신보다 먼저 새끼가 떠난 대도 붙잡지 못하는 미력한 애비

6년 전 벚꽃이 만개 한 때, 예쁜 조카가 서른 초판 나이로 첫 출산 중 의료사고로 신작로 환한 꽃길로 먼저 갔다. 올해 5월 매화꽃 만발한 때 그녀의 아들 민준이도 엄마 따라 하얀 미소 지으며 따라 나섰다. 매형은 눈물로 지센 밤을 부엉이 애비 되어 울고 있다.
작년 12월 백공 선배 서른 후반 딸이 핏덩이 딸 민지를 순산하고 자신은 정작 몹쓸 병마를 이기지 못 하고 서방정토로 떠나갔다. 그 선배가 “부엉이의 겨울”이란 시집을 출간하고 동인지 창간호 축하 행사에 시집 한 권을 전해 주었다.
문 듯 표지만 보고 깔끔한 편집에 간간이 삽입된 크고 진한 칼라 사진은 작년 겨울 백공선배의 고충을 언뜻 접했다. 행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조용히 책상에 앉아 시를 읽어 내려갔다.
한 시름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깜깜하게 깊어가는 겨울 숲에서 움직 일 수 없었다. 달랠수록, 부르 질수록, 더 빨라만 지는 딸의 호흡은 내 심장을 망치질하고...... 뼈만 남기고 달아나는 살들을 돌아오지 않는 다는 대목에서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세상의 인연 중에 자식과 부모의 연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선 뚯 내 주는 것이 부모마음이다. 애지중지 키워 늦깍기 배우자를 만나 잉태의 기쁨도 잠시 자신에게 스며든 암기 말 판정은 가족에게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6년 전 둘 다 공직에서 만나 오순도순 살며, 2년 간 임신이 잘 안 되어 대구까지 가서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기를 갖고 양가는 물론이고 친구, 지인들 모두 축복 속에 순산을 기다렸는데,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로 산모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아이는 겨우 출산되었지만 대변흡입증세로 뇌 손상을 입고 6년을 방에서 투병하다고 끝내 저 유심정토로 보낸 외할미 외할애비는 천~상 부엉이 부부다.
엄마가 있어도 엄마의 젓을 단 한 번도 물려 보지 못한 아기,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방에 누워 덩그러니 하늘만 바라보던 아기, 장작개비 같은 새끼를 눕혀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애비나 출산을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몸이 퉁퉁 불어 싸늘한 주검으로 다가온 새끼를 가슴에 담아야 하는 애비는 둘 다 부엉이 애비다.
세상에 오게 할 줄만 알았지 자신보다 먼저 새끼가 떠난 대도 붙잡지 못하는 미력한 애비는 부엉이 애비다.
부엉이는 말하지 않아도, 소리 내어 울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음은 동지이기 때문이다. 말로 하지 않고 시로 표현한다는 것은 선배의 특권이기도 하다.
인생은 묘하다 했던가? 인생은 평등하다고 했던가? 내게 주어진 고통의 끝은 어느 정도 살아보면 인생은 롤러코스터란 말을 실감한다. 내 안에 예쁜 조약돌하나 이별로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내 가슴 안에 움크러진 응어리도 언젠가는 실타래 마냥 풀리지 않을까!!
강물이 흐르듯, 인생은 그렇게 흐르고, 변하고, 사라진다. 성난 바람도, 모진 혹한도, 세찬 눈보라도, 서릿발 내린 새벽길도 어느새 녹아 봄 길을 재촉하고,산수유 밭을 일구고 만다.
겨울은 거리 혹독해도 봄을 맞이하는 가슴 한 칸에 그 자리를 내 주더라. 부엉이 애비에게도 복수초는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