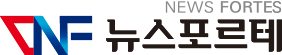11월 하순이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한국물가협회는 초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무와 배추 등 주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 담기는 우리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연중행사이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반년 양식이라고 하셨다. 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먹거리이다.
단순히 반찬의 위치를 떠나 각종 찌개에도 들어가는 부식의 으뜸이다. 소식에 의하면 올해 김치수출이 3만톤에 육박하며 1억달러 도달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부식이 된 것이다.
이젠 결혼하여 외지에서 사는 아들이 얼마 전 왔다. 저녁 식사 중이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이 김치, 어머니가 담그신 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한다. “응, 그것 옆집에서 보내온 거야”하는 아내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40년이 넘게 매일 같이 먹어온 아내의 김치 맛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식탁위에 오르는 반찬은 알려 주지 않으면 아내가 만든 것으로만 알고 먹어 왔다. 제 어미가 해주는 김치 맛을 알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 아내의 손맛을 모르는 내가 멋쩍어졌다. 김장은 그 집의 고유한 맛을 갖고 있다.
지금도 우리 집 김장을 담글 때면 아내가 초청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다. 오래전 대전으로 이사와서 알게 된 이웃에 사시는 분이다. 이젠 이웃사존의 정이 들어 아내와 형제처럼 지낸다. 김장 전날 밤, 늦게까지 썰어 놓은 각종 양념들과 젓갈을 대야에 옮긴다. 그리고는 아내보고 버무리라고 한다. 절대로 맨손으로 버무려야지 비닐 장갑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재료의 비율은 맞추어 주지만, 마지막은 주인이 반드시 맨손으로 버무려야 그 집의 김치 맛이 된다는 것이 그 분의 지론이다.
어느 정도 버무려지면 맛을 본다. 그리고는 “됐어, 제 맛이 나네”하고는 씻어 놓은 배추에 속을 넣기 시작한다. 한 번은 집에 들른 큰애에게 김치 맛을 물어 본적이 있다. “아, 작년하고 같아요”. 제 어미의 손맛을 기억하는 것인지, 아닌지 신기하면서도 아리송하기도 하다.
김장철이면 이웃의 주부들이 품앗이 형태로 돌려가면서 김장을 한다. 그간 쌓인 이야기도 나눈다. 이웃 집 남편 흉도 보고, 먼 곳으로 나가 사는 아이들의 안부도 나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신부 신랑의 혼담을 주선하기도 한다. 김장 품앗이는 어찌 보면 아낙들의 토크쇼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장 담기는 노인들의 구식 생활 모습이 되고 젊은이들은 귀찮은 일이 된 듯하다. 김장 담는 과정이 복잡하고, 양념을 손에 묻히기 싫어하고, 1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그보다 더 한 것은 “중국산이네 어쩌네” 하면서도 공장 김치를 사다 먹는다. 하긴 요즘은 편리하게 절인 배추도 팔고, 맞춤식 김장도 해준다고 하지만...... . 손맛이 잊혀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손맛은 주부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랑과 정성이다. 사랑의 기(氣)이기에 기가 듬뿍들은 음식이야말로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가족과 이웃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김장을 담는다면 그것도 한국정신을 이어가는 작은 일중에 하나는 아닐까? 그리고 어머니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대로 이어가는 가정의 고유한 손맛을 지켜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아내의,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는 김장 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