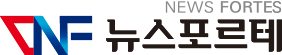지난 대보름날 전, 모처럼 아내와 대전도마시장에 갔다. 정월 보름 부럼을 산다기에 어릴 적 생각을 하고 따라갔다. 시장에는 보름을 맞이하여 각종 나물과 호두, 밤 등 부럼들이 풍성했다.
비닐 봉지에 깔끔하게 담겨진 밤과 호두를 보며 아내에게 “저거 꽤 크네, 사자”고 하니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시장 끝 구석진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좌판에 밤과 호두를 풀어 놓고 팔고 있었다. 아내가 바가지에 담겨진 호두와 밤을 사니 할머니는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준다. 그리고는 “옛수, 이건 덤이야”하면서 한 주먹 씩 넣어 준다. 한 주먹이라고 해야 서너 알이나 될까? 그제서야 아내가 시장 끝가지 온 까닭을 알았다.
요즘은 정량제가 되고, 포장되어 팔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덤“이다. 덤-시장이나 가게에서 자주 보아왔던 우리의 상거래 문화이다. 항상 물건을 사고는 ”덤 좀 주세요“하면 가게 주인들은 싫지 않은 목소리로 ”이문이 남지 않는데 덤까지 달라느냐”며 한 웅큼 집어 주는게 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덤 :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덤은 주로 곡식이나 열매 등 먹거리를 살 때 이루어진다. 공산품에는 덤이 없다. 버스 10대 살 때 승용차 한 대는 덤으로 주지 않는다.
퍽 오래 전 쌀을 파는 곳에서는 말(斗)에 쌀을 가득 담고 둥그런 막대로 입구를 쓱 밀어버린다. 그런데 끝부분에가서는 1-2cm정도 남겨 덤을 주었다. 정육점에서는 고기 1근 달라면 1근을 달아주고는 비계나 기름이 붙은 살점을 덤으로 한 조각 잘라 주었다. 과일가게에서는 벌레가 먹거나 좀 훼손된 과일, 좀 작아 상품 가치가 덜한 것을 한쪽에 모아 놓고 덤으로 주었다. 콩나물을 살 때도 항상 한 웅큼 덤을 받았다.
덤을 받으면 왠지 즐겁다. 집으로 오는 길에도 아내는 “그 할머니만 덤을 줘. 그래서 거기서 사는거라”고 한다. 상품 가치는 약간 덜해 보여도 덤을 주는 맛에 할머니에게 가서 산다고 한다. 어느 사이 우리에게서 ‘덤 문화’는 슬며시 사라졌다. 있어도 시장 한 구석의 할머니들이 있는 좌판에나 가야 -나물이나 푸성귀를 살 때- 덤을 볼 수 있다. 또한 요즘은 덤을 잘 주지도 않는다.
요즘은 덤을 대신해 슈퍼마켓 등에서 1+1을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1+1이 결코 싼 값이 아니라는 분석을 보고 나니 더욱 덤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 웅큼 더 얹져 주는 덤과 잘 포장되어 묶여져 있는 1+1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40여년 전 천안의 모 시골에서 근무했을 때, 딱 한 곳 가게 겸 주막집이 있었다. 어쩌다 퇴근길에 동료들과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주인 아주머니가 덤으로 한 잔 씩 더 주기도 했고, 두부 찌개에도 덤으로 두부를 몇 조각 더 넣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인정이 덜하다. 비슷하게 무한리필이라는 게 생겼다. 그런데 그 뉘앙스 역시 덤보다는 못한 듯 하다.
덤은 인정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는 맛이다. 찾아 온 손님에게 인심을 나누고, 그 인심에 반하여 또 찾아가고...... . 그런 삶이 우리의 미풍이고 양속이 된 것은 아닐까?
지난 연말부터 몰아친 AI와 그 뒤를 이은 구제역 파동에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의 삶이 더 오그라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탄핵 정국’은 우리들 마음을 더 냉냉하게 만들고 있다. 우수가 지났다. 며칠 후면 경칩이다.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도 풀린다는 옛말처럼 지난 겨울을 지나며 얼어 붙은 정치와 경제와. 우리들 마음이 풀려 3월의 희망찬 솟아남의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후한 인심과 사랑의 덤처럼 인정이 나누어지는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